한국YMCA운동의 역사적 이해1)
1. YMCA 출범의 민족운동사적 맥락
한국 YMCA의 창립 움직임은 대한제국 정부가 민회(民會)를 금지시키고 독립협회를 해산한 이후인 1899년 가을, 배재학당을 비롯해 관립 외국어학교 등에 다니던 150명의 청년‧학생들이 연명으로 YMCA의 설립을 청원하면서 태동하였다. 당시 그들은 하류층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교회와는 별도로, 자신들과 같은 양반 지식층 청년들이 모일 공간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미국과 영국에 유학하고 돌아온 여병현을 간사로 하여, 정회원‧준회원‧명예회원의 회원조직에 선교사들과 정회원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아펜젤러(H. G. Appenzeller)의 집을 임시 회관으로 빌려 YMCA를 조직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 단체가 독립협회나 협성회같은 정치단체로 발전할 것을 우려한 정부의 저지로 그같은 시도는 일단 무산되었다.
한편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두 선교사는 뉴욕의 북미YMCA 국제위원회에 한국YMCA의 창설을 청원하였고, 이러한 국내의 요구에 바탕하여 북미YMCA 국제위원회는 1900년 라이언(D. W. Lyon)을 파견하여 현지 조사작업을 진행시켰다. 그리고 이듬해 한국에 YMCA를 창설할 목적으로 질레트(P. L. Gillett)를 파송하였다.
1901년 한국에 온 질레트는 곧바로 배재학당 학생들로 기독교청년회(YMCA)를 조직하였다. 그런데 1901년 9월에 내한한 질레트가 한국어를 익히기에도 시간이 빠듯했던 처지에서 곧바로 학생YMCA를 조직했다고 하는 것은 선뜻 수긍이 가지 않는 부분이다. 따라서 1899년 아펜젤러의 집에서 모인 것과 같은 친목회 형태의 모임이 우리나라 근대 학생운동 단체의 효시라 할 수 있는 협성회의 후신격으로 배재학당 내에 존속하다가, 질레트의 부임에 이르러 학생YMCA로 재편 내지 추인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아무튼 배재학당 학생YMCA의 출범은 만민공동회운동 당시 이미 두각을 나타냈던, 협성회로 대표되는 학생세력을 YMCA운동 속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배재학당 학생YMCA는 창립과 더불어 1901년 11월 제3차 중국 학생YMCA 전국대회 때 홍콩 학생YMCA와 함께 정식 회원으로 가맹하여, 중국‧한국‧홍콩 YMCA 전체위원회(General Committee of YMCAs of China, Korea and Hong Kong)를 구성하였다. 이후 질레트는 도시YMCA의 조직에 착수하여 1903년 10월 28일 정동 유니온클럽에서 황성기독교청년회를 창립하였다. 이로써 YMCA는 서울에 살고 있는 지주와 관리, 청년회를 필요로 하고 있던 청년‧학생층 등 두개의 그룹을 시청년회와 학생청년회 조직에 결합시킴으로써 사업(service)과 운동(action)을 겸비하는 기독교 사회운동체로서의 모습을 갖추어 나갔다.(김천배-‘하나님나라의 확장’에 역점을 두는 학생YMCA의 ‘운동지향성’과 덕‧지‧체‧사교의 일상적 훈련을 중시하는 도시YMCA의 ‘사업지향성’의 해후)
그런데 출범 당시 황성기독교청년회는 초기 임원진과 이사진 대부분을 미국․캐나다 출신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국제적 성격의 단체였다(초대회장 헐버트). 이러한 가운데 황성기독교청년회가 한국민족운동사에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던 계기는 개혁당사건으로 한성감옥에 구속된 이상재, 이원긍, 유성준, 홍재기, 김정식 등 개혁파 관료들이 러일전쟁 이후 출옥하여 집단가입을 하고, 윤치호, 김규식 역시 여기에 가세를 하면서부터였다. 실무진용에서도 1904년 후반부터 수석 간사(副總務) 김정식을 정점으로 김규식, 육정수, 이교승, 김종상, 최재학 등 신교육을 받은 한국인 간사들의 진출이 두드러졌다.
무엇보다 이상재를 비롯한 대한제국 개혁파관료 출신 인사들의 집단 옥중개종과 출옥후 황성기독교청년회 집단가입은 한국 YMCA운동의 주체형성에 새로운 전기를 제공하였다. 그들은 게일(J.S. Gale) 목사가 시무하던 연동교회에 출석하여 세례를 받고, 황성기독교청년회에 집단 가입하는 한편, 연동교회 교인들을
1) 장규식, 중앙대 사학과 교수, 2007년도 간사학교 강의록
한국YMCA운동의 역사적 이해(장규식).hwp
.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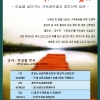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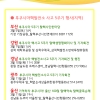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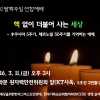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