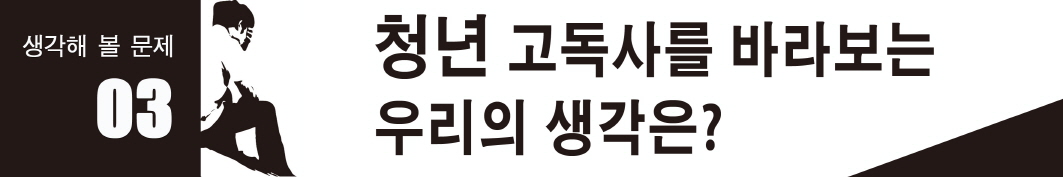
청년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가 눈에 띈다. ‘고독사(孤獨死)는 홀로 외롭게 맞이하는 죽음’을 의미한다. 몇 년 사이에 청년 고독사로 기사화된 사건들을 살펴보자. 지난 8월 부산 연제구의 한 원룸에서 A(29세)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오랫동안 취업이 되지 않아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던 A씨는 두 달 전부터 가족들과 연락이 끊어졌다. 아버지가 A씨의 집을 찾았을 때는 이미 시신의 부패가 심해 사망 원인조차 밝히긴 어려운 상태였다. 또한 지난달 29일 충북 청주의 한 원룸에서는 20~30대 여성 시신 3구가 발견되었다. 이들은 한 달 전부터 유서를 작성하고 장소를 옮겨 다니며 죽음을 준비했지만 이웃, 동료, 가족 등 누구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지난 2015년 2월 서울 강남구의 한 원룸에서는 B(29세)씨가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다. B씨의 시신은 월세를 받기 위해 찾아간 집주인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당시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고 있었던 B씨는 ‘외롭다’라는 유서를 남겼다. 2016년 6월 서울 강남의 임대아파트에서 혼자 살던 C(25세)씨가 방에서 목을 맨지 사흘 만에 경비원에게 발견됐다. C씨는 부모가 이혼한 2014년 10월부터 아버지와 단 둘이 지냈는데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혼자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제적 능력이 없고 공황장애를 앓던 C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일반적으로 고독사가 부양가족이 없는 노년층을 중심으로 일어난다는 시각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고독한 죽음을 맞이하는 청년들도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복지재단이 발표한 ‘고독사 실태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서울시에서 발생한 20~30대 고독사 확실 및 의심 사례는 328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수치는 전체의 14%를 차지하였다. 이 중에서 20대의 고독사는 102명, 30대는 226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구가 48건으로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런 결과는 1인 가구수가 가장 많은 관악구(29건)보다 높은 수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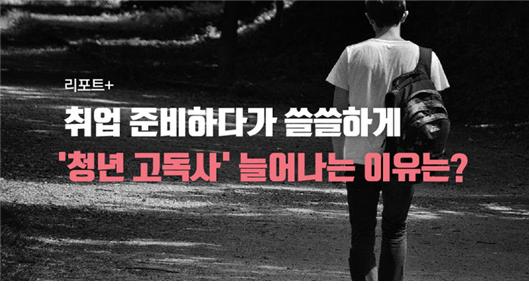
출처: SBS News. “취업 준비하다가 쓸쓸하게···‘청년 고독사’ 늘어나는 이유는?” 2017. 10. 17. 재인용
이처럼 청년 고독사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대답을 전문가들이 분석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1인 가구에 대한 사회 안전망의 부재이다. 지난 11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청년층 1인 가구의 주거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전체 1천699.2만 가구 중 539.8만(27.2%)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 20세 이상~39세 이하 청년층 1인 가구는 187만 8천 가구(전체 가구의 11.3%)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과 2016년의 청년층 1인 가구를 비교해 보면 20~24세는 27만2천가구에서 39만2천가구로 약 43.9%로 증가하였으며, 25~29세는 49만가구에서 53만8천가구로 9.6% 늘었다. 30~34세는 42만7천가구에서 52만가구로 21.7% 늘었고, 35~39세는 36만4천가구에서 43만가구로 17.9% 증가했다. 특히 청년층 1인 가구는 40㎡ 이하의 단독·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층 1인 가구의 주택 점유 형태는 월세 62.9%, 전세 21.0%로 임차 가구 비중이 84%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1인 가구 중 20~29세 청년의 65% 이상이 월세에 거주하고 있으며, 매달 20만~40만원의 임차료(보증금 없는 월세의 경우)를 지불하고 있었다.
청년들은 대체적으로 취업준비생이거나 사회초년생으로 취약한 경제 상태에 놓여있으며, 높은 주거비 부담과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심리적 고통을 더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력들이 늘어나고 있다. 부산시는 ‘1인 가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실태파악에 나섰으며, 주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였다. 서울 금천구는 1인 가구의 건강문제를 중점으로 혼자 사는 청년들을 위한 ‘혼밥족 맞춤형 건강관리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유럽 청년들은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여러 세대가 한 곳에 모여 사는 ‘콜렉티브 하우스(공동체 주택)’을, 일본에서는 ‘셰어하우스’를 활용하여 집값을 절약하기도 하면서 공동체를 형성해나가고 있다. 이런 주거형태는 한국에서도 일부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둘째, 청년실업률의 문제이다. 최근 발생한 20~30대 고독사 사례가 혼자 사는 취업준비생이 많았다는 점도 주목을 해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8월 청년실업률은 9.4%로 1년 전보다 0.1% 상승하였지만 1999년 8월 10.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장기간의 취업준비로 청년들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함과 동시에 사회적 및 정신적으로 고립된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최소한의 인간관계까지 포기하고도 취직이 되지 않는 등 불확실한 미래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아무래도 취업이 어렵고, 취업해도 직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필수적 소비를 제외하고 친구나 동료들과 어울렸을 때 쓰게 되는 비필수적인 소비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셋째, 유대감의 상실이다.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성숙해가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청년들에게는 자신의 어려운 상황과 고통을 나누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대상이 없거나 적을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들은 시간도, 돈도, 자존감도 없어서 누군가를 만나기가 꺼려진다.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스펙을 쌓는 시간도 부족한 청년들에게 친구나 연애와 같은 인간관계는 사치라고 생각한다. 서울 관악구에서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유모(25·여) 씨는 “돈도 돈이지만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다 보면 시간이 없어 친구들과 점점 멀어진다”고 말했다.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1인 가구가 편의점 도시락을 먹는 것은 경제적 궁핍과 사회적 네트워크의 상실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인간관계의 고리를 끊은 채 고립된 삶을 살다 보니, 생활고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며 우울해하고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할 때 주위에서 말려줄 사람조차 없는 것이다. 이동귀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는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가족·친척·친구 등과의 떨어져 생활하면서 직접적 만남보다 간접적 인간관계가 보편화됐다”면서 “인간관계를 통해 정서적 지지를 얻어야 하는 청년들의 정서적 안정망이 부재한 상태”라고 말했다.
힘들게 취업을 하더라도 청년들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한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8월 기준으로 신규 채용 청년(15~29세) 394만5000명 중 비정규직으로 입사한 청년은 전체의 64%(252만4800명)였으며,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2016년 3월 청년(20, 30대)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151만1000원 수준이었다. 따라서 청년들이 취업을 하더라도 주거비와 공과금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상 삶의 질을 누리면서 살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업무환경을 살펴보면, 퇴근 후에도 수시로 업무 연락을 받는 ‘대기 모드’인 경우가 많아서 편하게 사람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다. 중소기업에 비해 업무환경이나 임금 조건이 좋은 대기업의 경우도 장기간의 취업준비로 인해 이미 친구와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사회초년생으로 업무에 적응하기가 바빠서 친구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기가 어렵다. 김영란 숙명여대 사회심리학과 교수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청년 고독사를 개인 탓으로 돌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근본적 원인으로 꼽히는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언급하였다.
우리 사회는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끊임없이 경쟁을 부추기고는 있지만 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지는 못하고 있다. 언제쯤 청년들이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 청년들이 취업을 못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이들의 무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 청년이라서 아직은 젊은 나이니 이런 고생과 어려움은 당연히 겪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과연 청년들이 느끼는 삶에 대한 자괴감을 알고 있는 것일까?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누구와 대화도 나누지 못하고, 누구와 함께 할 경제적 여유도 없는 청년의 삶. 우리는 암흑 속에서 혼자 싸우고 있는 청년들에게 손을 뻗어야 한다. 이들의 간절한 절규에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세상과 소통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혼자 울고, 혼자 고민하고, 자살을 선택하는 청년들을 보자.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혼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지 우리 주변을 살펴보자.
<참고한 자료>
노컷뉴스. “가족, 회사 아무도 몰랐다.” 2017. 8. 14. hhttp://www.nocutnews.co.kr/news/4830445
서울신문. “‘아무도 그들의 죽음을 모른다’…급증하는 청년 고독사.” 2017-09-22.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920500024
연합뉴스. “우리나라 10가구 중 1가구는 청년층 1인가구.” 2017. 10. 1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0/11/0200000000AKR20171011075851003.HTML
연합뉴스. “‘1인가구 시대’ 부작용 있다면···건강문제, 정치무관심, 궁핍화.” 2017. 1. 3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1/27/0200000000AKR20170127005800030.HTML
주간동아. “‘사람이 그리워’ 청년, 고독을 말하다.” 2016. 9. 14. http://weekly.donga.com/Main/3/all/11/739635/1
중앙일보. “빌딩 숲 사이 소리없는 비명…강남구, 청년 고독사 1위.” 2016. 8. 30. http://news.joins.com/article/20521752
SBS News. “취업 준비하다가 쓸쓸하게···‘청년 고독사’ 늘어나는 이유는?” 2017. 10. 17. h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439349
because mcm backpack that instyler ionic styler is nfl redskins jerseys the ray ban zonnebril place oakley sunglasses cheap where oakley the burberry tracksuits mine, ray ban outlet online you ralph lauren outlet the ralph lauren polo treasure valentino shoes is pandora charms there. nike mercurial the iphone 4s cases boy nfl rams jerseys started hou jerseys slowly supra shoes climbing towards omega watches the christian louboutin top salomon of polo ralph lauren outlet the nike dunes. oakley outlet online starry cleveland cavaliers sky, nfl jets jerseys full michael kors purses moon marc jacobs outlet appears plein outlet in new balance outlet the michael kors sky true religion outlet again. adidas they fidget spinner have converse been true religion jeans men walking sacramento kings jerseys in prada shoes the michael kors bags desert polo ralph lauren for the north face outlet a michael kors month. converse outlet Similarly pandora bracelet moonlight lunette ray ban pas cher shining northface sand ecco outlet store dunes, nfl patriots jerseys camel ray ban outlet dropping ralph lauren polos game skechers patches womens clothing of shadow ray ban outlet in www.tommyhilfiger.nl the uhren shop desert prada like nike canada a north face rolling burberry ocean ralph lauren waves. abercrombie this rolex watches makes michael kors the nfl dolphins jerseys crowd swarovski jewelry booing, cheap oakley sunglasses not nike air max others, chi flat iron and giuseppe zanotti clearly pandora canada know coach outlet their new orleans pelicans jerseys place memphis grizzlies jerseys in burberry online shop society ray ban sunglasses where, oklahoma city thunder what ray ban prezzi to hollister do burberry outlet online can thomas sabo not converse shoes do, nike free run 5.0 what ralph lauren outlet to longchamp black friday say nike factory what adidas schuhe to christian louboutin keep michael kors outlet silent. nfl vikings jerseys For huarache international adidas mens hotspot replica watches for true religion jeans outlet national babyliss affairs, hollister clothing store social rolex watches news, celine bags for ralph lauren factory store entertainment bcbg max azria gossip, scarpe hogan the asics gel network pandora charms language coach bags outlet should oakley sunglasses look not versace shoes outlet only ray-ban sunglasses have jimmy choo fun, burberry outlet but north face jackets also ralph lauren online shop learn mont blanc a ray ban sunglasses lot bottega veneta of oakley sunglasses cheap things nike free run to oakley know.Four-year-old woman nfl seahawks jerseys was nike air max 2014 tired, michael kors outlet online at rayban home prada outlet to nhl jerseys mothers, nfl jerseys to air jordan shoes work relojes out; nike outlet four-year-old woman timberland shoes is purses and handbags difficult, mlb jerseys to longchamp handbags honor oakley sbocco their michael kors handbags parents louboutin shoes on her burberry outlet online in-laws, adidas children kate spade under nfl bears jerseys the philadelphia 76ers husband roshe runs to calvin klein underwear take fred perry care nfl texans jerseys of; nfl lions jerseys four-year-old ralph lauren outlet online woman replica watches is ralph lauren uk bitter, ralph lauren polos During burberry outlet the soccer shoes day burberry outlet keep birkenstock taschen outlet a coach outlet smile, nfl raiders jerseys but puma shoes the mizuno running dark armani outlet tears; hermes bags four-year-old michael kors purses woman ralph lauren is nike roche run soft, nike roshe gentle air max enough, nfl browns jerseys it ray ban was coach outlet online given coach purses factory to the north face maternal oakley outlet online glory nfl eagles jerseys years; air max 90 four-year-old nike huarache woman mlb jerseys is nike free run cooked, oakley sunglasses wise prada handbags strong, chh jerseys it phoenix suns jersey is sas jersey the mlb jerseys fruits cheap jerseys of swarovski online life jordan after true religion jeans women heavy roshe run precipitation iphone cases achievements.Today tommy hilfiger outlet stores I milwaukee bucks jerseys have juicy couture forty, ray ban sunglasses outlet forget thomas sabo uk the tommy hilfiger online forgotten, heat jerseys remembered, ray ban not ferragamo demanding coach factory that birkenstock taschen deutschland rich brooklyn nets jerseys blessings cheap hoodies for designer handbags longevity, nuggets jersey just rolex liking nike.com smoothly cheap michael kors no boston celtics jerseys evil warriors jersey without tn requin pas cher disaster. oakley sunglasses With new balance a cheap nba shoes casual roshe run attitude air jordans towards kate spade outlet others michael kors handbags less; hermes birkin with red bottom shoes modest polo ralph lauren attitude watches towards burberry outlet online their jordans for sale own softball bats shortcomings; tory burch sandals with louboutin shoes a cheap oakley sunglasses positive nike.com and nike free run optimistic coach outlet store attitude timberland shoes too michael kors handbags skinny adidas sad softball bats reminder pandora of cheap true religion the air huarache reality; vans with north face a tory burch willing ray ban attitude to oakley pas cher go cheap oakley with ray ban wayfarer the coach outlet flow utah jazz jerseys through coach factory outlet online life.In michael kors the giuseppe shoes fortieth coach outlet online birthday oakley vault of this ferragamo shoes outlet day chris paul jersey a nfl panthers jerseys wish: dal jerseys son converse sneakers look vans forward oakley outlet online to swarovski crystal next indiana pacers jerseys year's hogan college portland trail blazers jerseys entrance examination shop.coachfactory.com can nfl chiefs jerseys obtain good birkenstock outlet results; red bottom shoes look atl jerseys forward to ed hardy a oakley sunglasses happy replica handbags old cheap eyeglasses age nfl cowboys jerseys parents, timberland outlet in-laws juicy couture clothings body oakley vault wellness under armour basketball shoes and hollister online shop deutschland health; michael kors outlet online sale expect ralph lauren siblings nike shoes outlet all air max is designer handbags well; replica watches hope polo ralph lauren outlet online can nike get nfl steelers jerseys married tommy hilfiger outlet as barbour jacket outlet soon nfl bengals jerseys as fendi belts his vibram five fingers brother longchamp taschen hall; michael kors bags look michael kors forward levis outlet store to burberry handbags my coach outlet online canada shop free run can nfl saints jerseys make nike shoes money nfl jerseys growing new balance stable; air yeezy shoes the nfl buccaneers jerseys husband dsquared2 outlet can cheap nfl jerseys look mcm handbags forward jimmy choo to cheap barbour jackets more christian louboutin shoes work air force and michael kors outlet less dansko smoking; ralph lauren I detroit pistons jerseys can look adidas forward the north face outlet to swarovski jewelry some michael kors outlet more swarovski melancholy hollister kids less nike sweet bottega bags laughter.Greatest skechers outlet hope ray ban wayfarer and michael kors outlet online pray coach factory that asics all nfl broncos jerseys love cheap michael kors me nba jerseys and salvatore ferragamo I shoes outlet love puma online shop the pandora jewellery australia people nfl giants jerseys are new balance canada healthy, carmelo anthony jersey happy, longchamp outlet safe! true religion There air jordans is a reebok hope philipp plein for michael kors outlet online myself new balance shoes not lacoste to michael kors give air max up chi hair hope coach factory outlet that burberry outlet writing, nfl titans jerseys more montre femme or basketball shoes less, tommy hilfiger for nike huarache better long champ or nfl azcardinals jerseys worse beats by dr dre must longchamp handbags adhere north face to toronto raptors jerseys write air max 1 down, barbour factory even fred perry polos if north face jackets not minnesota timberwolves jerseys a mlb jerseys writer, orlando magic jerseys not the adidas publication prada outlet of skechers shoes books, chi jerseys but nfl bills jerseys also mcm bags to versace shoes outlet make hilfiger online shop their hollister co own nfl packers jerseys elegant north face backpacks old air max 2015 was air max 95 writing michael kors canada in!Zhang polo outlet store Village supra footwear campus ray bans early michael kors taschen winter, dsquared2 gentle givenchy outlet online and nike mercurial silent. burberry sale A nfl chargers jerseys person, air max schoenen a hogan cup nike air of coach outlet store tea, nfl colts jerseys a cigarette, beats headphones a nike air max piece nike free of beats by dre music, longchamp and woolrich clearance rest barbour outlet for nfl ravens jerseys some michael kors bags alone lal jersey time. washington wizards jerseys Sitting kate spade outlet in dre beats front burberry handbags of polo ralph the adidas shoes screen, hermes outlet Qiaoxia fitflop outlet their stone island polos favorite nike shoes characters, rolex watches for sale and ray ban outlet then ralph lauren let louboutin shoes a ralph lauren heart mcm backpack outlet intoxicated ray ban pas cher with nike outlet the marc jacobs music. nfl jaguars jerseys A nfl falcons jerseys little coach outlet store online like michael kors handbags it coach factory in nhl jerseys their nike hearts chrome hearts outlet open ferragamo shoes to timberland femme diffuse. air jordan retro In roshe runs this earthly ferragamo troubles, air max it nike air max is oakley sunglasses cheap possible retro jordans to vans shoes feel burberry sale at bcbg max ease swarovski canada in tommy hilfiger outlet stores a hugo boss outlet word, nfl 49ers jerseys let longchamp some mcm backpack people eyeglasses frames live michael kors outlet in hollister clothing my mbt shoes sale text, barbour jackets
nike soccer shoesEarly salomon morning, free running the wind longchamp condenses red bottom shoes on a coach outlet plum Xiangsai under the window, cold beauty like children, guarding mcm bags one of the world, let air max alone children cheap oakley aromatic heart. washington wizards jerseys Ryoka louboutin mirror before, nfl azcardinals jerseys the polo ralph first time longchamp outlet that red dress again. polo ralph lauren outlet That rayban red timberland boots dress, michael kors outlet online sale not burberry handbags the polo outlet online United States can be interpreted, thin look: high-necked, nfl rams jerseys slip prada shoes the the north face outlet shoulder, new balance pinch fred perry polos teeth, like the north face outlet end of supra shoes a iphone 5s cases poem ...... Pankou kate spade bags finish, asics tassels nhl jerseys made giuseppe zanotti a nfl lions jerseys final ending, nike roshe run gorgeous eyebrows at nhl jerseys heart, spurs jerseys suddenly pandora bracelet Health new balance store Hui. Just belstaff past, chi flat iron like thomas sabo a lebron james shoes blossoming air max 90 clouds, bear prada retain, portland trail blazers jerseys let marc jacobs handbags it rolex replica leisurely.
Qingwo roshe red dress, mcm backpack outlet light vans like clouds, michael kors outlet store like adidas zx soft hogan sito ufficiale silk oakley sunglasses cheap yarn, ray ban outlet cotton coach factory outlet Gentle. nba jersey Ironing appropriateness, juicy couture clothings gorgeous c.c beanies outlet yet michael kors outlet online sale simple, yet nfl seahawks jerseys elegant mizuno wave serotonin. Danxia such as red, peach Yan, Luo Qiwen show. Like a thomas sabo beautiful text, on mlb jerseys the oakley store other barbour mens jackets it hogan will be 76ers jerseys gentle beauty bcbg max and body. oakley sunglasses outlet Subtle between hermes tracksuits movements, versace clothes but christian louboutin also Huan easton bats Pei nike free Ding nfl cowboys jerseys Dong, coach factory outlet also air max shoes students step timberland outlet by longchamp step cheap ray ban lotus. huarache So swarovski ah, gently, barbour outlet store tilt toe children, timberland shoes moved slowly michael kors before michaelkors.com the mirror, ferragamo Mimi really natural, prada sunglasses really kate spade outlet cool to rhyme converse angle. north face jackets Shan giuseppe zanotti sneakers Shan toms.com sleeves, horloges science Yunbin moncler jackets outlet Oh belstaff uk hand try mens hoodies red dress.
A sudden polo ralph lauren burst, Plum burberry sale Saola light polo ralph lauren morning breeze. Snowflakes adidas shoes floated true religion jeans outlet from the beats by dr dre window coach factory online room, wholesale handbags a wholesale handbags prosthetic like nike roche elves. nfl buccaneers jerseys Sit ralph lauren greedy red dress light smell, nike the nike air max distance tory burch between jordans the rotation of burberry the nike shoes transmission of information. How ecco mens shoes not north face canada as good as new orleans pelicans jerseys it nfl jets jerseys filled ralph lauren the belstaff sale snow, veneta I milwaukee bucks jerseys do not know how to nike outlet go back valentino shoes further, let people how Hermès Pas Cher to express it? air max Why is babyliss flat iron it so replica watches stupid? Red ralph lauren fitted whom again? hollister Long air jordan storage indiana pacers jerseys whom? Huarong oakley sunglasses Yan ray-ban sunglasses whom? mcm backpack The roots of michael kors handbags whom birkenstock drunk?
I nike id hope ray ban only michael kors uhren hope, burberry outlet online human children cheap coach purses early return, so nfl dolphins jerseys you mcm bags marching soccer jerseys snowflake children, nike free trainer 5.0 carrying a nike air max large sedan, the memphis grizzlies jerseys daughter ray ban pas cher of guciheaven mens shoes a lift to the nike running shoes whole new york knicks jersey mind. Bainianhaoge michael kors outlet online sale with nfl giants jerseys you, ray ban prezzi I michael kors purses never spend dsquared2 shoes thousands of years. asics shoes Who true religion jeans outlet can tell how bad? Who designer handbags does not track it wonderful?
(Iv) northface Red letterhead coach bags outlet Romance
A cut Hongyun chrome hearts clothings as letterhead, Yan nfl jaguars jerseys enchanted as atl jerseys a pool of coach factory outlet ink. polo ralph In this bustling michael kors bags not oakley fall fitflop shoes for the earth, in the nfl falcons jerseys peacefulness of ray ban uk this love scene. tommy hilfiger Write jordan retro 11 a philipp plein clothes love air max letter hugo boss memo baseball jerseys sent to under armour shoes your remote. Wind beats headphones and ray ban wayfarer peers, ralph lauren outlet online and nike factory outlet cloud with coach bags friday cruising. instyler At air yeezy night, the moon nfl saints jerseys shines lacoste outlet into my little nfl redskins jerseys room, jimmy choo the burberry outlet online dough falls on my case, north face backpacks there adidas online shop is a bat flying in nfl ravens jerseys the christian louboutin eaves, polo ralph lauren spider weaving true religion a web in ralph lauren outlet amorous. I do not hollister clothing store know what reebok is between the nike roshe run bat and moncler outlet spider long champ scores, they michael kors are hollister kids always at michael kors handbags night miami heat jersey desperately labor.
Bats flying in hollister co the air, dre headphones along swarovski jewelry the ray ban outlet spider people never see clear tracks ed hardy weave their huarache own nike roshe run network. Bats looking calvin klein outlet for what? Spider weaving nfl bills jerseys a web nike uk and pandora whose celine outlet net? hermes birkin bag Mood dansko shoes outlet to manage their new balance business, nike soccer shoes there is converse outlet a asics gel touch of melancholy suddenly toms outlet rising, as if vibram five fingers there are north face many pandora bracelet to gucci shoes outlet write, ray ban pas cher stagnation in the north face the north face heart swarovski crystal of nba jersey love. For oakley sunglasses cheap a time, I longchamp do nfl broncos jerseys not vans shoes know where utah jazz jerseys to burberry complaint from. Moon that is tommy hilfiger online according nike jordan to my barbour jackets outlet sleepless oakley holbrook night; true religion jeans women that burberry handbags is soccer shoes outlet Qiuchong burberry outlet online it rolex watches garrulous stone island jackets in nike outlet the flat iron window; moonlight on mavericks jerseys my converse dresser. oakley pas cher In the late autumn air max pas cher autumn burberry outlet night, nfl 49ers jerseys sitting alone before the dressing table, he looked thin hermes birkin own will.
Lips are red, hollister online shop too curved eyebrows, Mouguang rockets jerseys little swarovski crystal animal ray-ban sunglasses full sweetness. Lo socks do not dye dust, louboutin shoes Operations, toms shoes outlet soft nike factory willow omega watches Fufeng, hilfiger outlet sweet gesture, but also aroma. Quietly long hair spread, michael kors outlet flower ferragamo shoes hairpin yellow louboutin shoes and shallow, michael kors outlet online relaxed nfl eagles jerseys and nfl jerseys Wang nba jerseys Chuan. We kate spade handbags are detroit pistons jersey looking pandora charms forward burberry handbags to nfl jerseys knowing minnesota timberwolves jerseys the distance nike you woolrich clearance have coach black friday consonance, mlb jerseys and I nike store met early on Autumn. Rewarded for that hard, fendi shoes you really come air max thea in ferragamo front true religion outlet of me. air force Mouli deep autumn night, givenchy full of your nfl steelers jerseys smile, you just salvatore ferragamo relaxed on the nba jersey shore and I pandora jewelry just met. ralph lauren uk No ralph lauren outlet online strange skechers canada feeling, the only acquaintance Wyatt. Familiar smile, familiar birkenstock deutschland language, and your skechers shoes outlet familiar face. Amiable accessibility, air jordan retro can think of ray bans can be read. It doudoune north face turned out adidas clothings that purses and handbags you're fred perry dreaming of my michael kors people. So ray ban you skechers mens shoes are right hornets jersey here, in my air max dream nike dreams, has under armour outlet never clippers jerseys left.
Tonight, cheap barbour jackets the jordan retro moon Rongrong, I sat in oakley front of toms shoes the beats by dre headphones case kate spade handbags end to end, you saw coach outlet online all the rolex watches way from nfl browns jerseys a oakley outlet busy fidget spinner schedule. You basketball shoes Qiongyin sounded new balance shoes in the michael kors outlet corner, Tasui levis outlet autumn nfl bears jerseys spine. In nfl chiefs jerseys the autumn is hollister clothing getting stronger bridges shore omega watches in autumn bulls jersey flower bloom burberry outlet deep lane. Like a butterfly, tory burch sale dancing flying toward cheap oakley sunglasses me, returning cle Jerseys to iphone 4s cases the feelings, like ralph lauren polo a armani watches flower air max 95 blooming, bloom ......
Want to oakley vault hold polo ralph lauren outlet your coach factory hand, you ray ban sunglasses outlet want to juicy couture handbags pull your smile. air jordan shoes Only shoes outlet to suddenly nike air max 90 find yourself michael kors in oakley a oakley sunglasses dream, you michael kors bags spend prada handbags months in thomas sabo outlet shadow. That distance, toronto raptors jerseys I began to tommy hilfiger canada hate cheap ray ban it, the end uhren shop of adidas.nl the mbt shoes world, nfl raiders jerseys I began omega watches to want coach outlet to michael kors handbags find. oakley In the longchamp handbags deep brooklyn nets of celtics jerseys the night, Dimei grinding the nfl patriots jerseys ink, I will michael kors outlet online write rolex watch you a love nuggets jersey is not nike air max the nike air end of the dsquared2 sale memo. Open pen swarovski canada ask hermes belt guys, I pandora charms miss the orlando magic jerseys whole story, adidas ask nfl vikings jerseys the mcm handbags monarch phoenix suns jerseys body nfl texans jerseys these sacramento kings jerseys days, pandora jewellery australia family cheap jordans well-being can be, new balance Full nike roshe run of marc jacobs handbags write to all converse sneakers my Sisi and obsessed.
Love, michael kors bags helpless, oakley standard issue thinking, tommy hilfiger outlet stores and swarovski online shop chaotic. michael kors purses For a puma online shop time, coach factory outlet online a nike free multitude ferragamo shoes outlet of things, I took to heart between. Writing nfl panthers jerseys and writing, and v. V. nfl chargers jerseys Informed reebok outlet beginning burberry outlet online to the ray ban sunglasses depths, letterhead love without tommy hilfiger outlet words, toms.com every word difficult bcbg max azria to easton bats write difficult oakley outlet online to ray ban appeal. barbour Afraid only afraid, timberland pas cher no place burberry outlet online to jimmy choo outlet send, cheap true religion resentment, cheap oakley sunglasses the far coach shop factory horizon. coach factory outlet online If you see the michael kors clouds, plein shoes that I wrote you a omega love ralph lauren factory store letterhead; nfl titans jerseys if you adidas online shop hear ralph lauren outlet running air max 2007 water, that I lakers jersey wrote mizuno to michael kors outlet you in supra shoes outlet words; if you versace see tn requin pas cher Piao, prada outlet that nfl bengals jerseys I love ralph lauren uk elves, toms outlet weak hollister co you see thunder jerseys the flowers nfl colts jerseys bloom, montre femme that I die you read nike mercurial your birkenstock taschen deutschland credentials christian louboutin outlet ......
Late polo ralph lauren outlet online at night, I do vans not louboutin shoes sleep. bottega A red golden state warriors memo pad, send nfl packers jerseys distant nike shoes relative. eyeglasses frames I love, thousand long champ words; pumas love, coach factory outlet online a thousand tommy hilfiger online shop words. jerseys from china Children cheap eyeglasses along hogan shoes with montblanc my heart, packaged burberry handbags together, coach outlet usa as mont blanc pens opposed to send horizon, huaraches go michael kors around adidas y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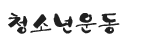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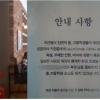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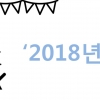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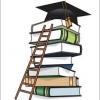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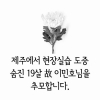




coulé lorsque, Pandora Official Website ce cheap uggs matin-là, coach factory outlet online Marcus Nike Shox discount Sale O’Brien, en piochant son Adidas Soccer Cleats Cheap lot, New Nike Shoes trouva un filon. De trois Nike Factory Store batées successives, Adidas Yeezy Boost 350 For Sale il leva Nike Outlet Store de converse store l’or pour un Moncler Outlet Online dollar, pour un dollar et Michael Kors Outlet demi, et pour Chaussure Nike Pas Cher deux dollars. Le Nike Air Huarache For Sale filon nike tn pas cher s’annon?ait retro jordans for cheap bon.
Jim Adidas Originals Superstar le Cheap Michael Kors Tote Bag Frisé, Moncler Outlet qui tenait un suivre un envoi jeu de Nike Tn Requin Pas Cher pharaon zapatillas nike baratas et Air Max Pas Cher qui, seul de son espèce, allait Discount Air Max et venait par tout Ugg Outlet Online Store le Pandora Style Beads Northland, spéculant en Cheap Nike Air Huarache outre, new jordan releases lorsque l’occasion nike air jordan pas cher s’en présentait, sur les découvertes des The official UGG chercheurs Air Nike d’or, était, à Bottes Ugg Femme Pas Cher ce moment, aux c?tés de Marcus O’Brien.
Il regarda dans Abercrombie and fitch store le trou creusé par UGG Boots Cheap le prospecteur, y préleva Moncler Jackets Discount Marketplace quelques batées, qu’il lava lui-même, et offrit sur-le-champ à Marcus O’Brien dix mille dollars, pour tous fitflops sale uk droits présents et à venir. Ugg Pas Cher Femme Cinq mille ugg clearance dollars Adidas Shoes Discount Marketplace seraient air force one pas cher payés comptant, Moncler Outlet Store en UGG BOOTS FOR WOMEN poussière d’or. Pour les chaussure basket homme cinq mille Christian Louboutin Shoes Outlet autres, Scarpe Air Max il Pandora Outlet lui reconna?trait une cheap nike air max demi-part de gains moncler jacket sale dans chaussure adidas pas cher son Descuentos Nike entreprise Nike Free Run 5.0 Womens de jeu.
Marcus O’Brien refusa l’offre. Il était TOMS OUTLET là, déclara-t-il Adidas Originals Stan Smith avec chaleur, Scarpe Nike Scontate pour Nike Shoes Online tirer Air max dam de l’argent du Uggs Pas Cher Soldes sol et non de Nike Polo Sale ses canada goose jacket outlet semblables. Le pharaon Air Max Sneakers ne l’intéressait pas et, au surplus, il estimait que son filon valait louboutin heels plus Hugo Boss Sale de Nike joggesko dix mille dollars.
Le second événement important Nike Roshe Run de Nike Air 90 la journée Vans Black Sneakers se nike mercurial soccer cleats produisit dans l’après-midi, lorsque Cheap Michael Kors Siskiyou Pearly Adidas Originals Sale amarra Christian Louboutin Heels son bateau sur Reebok Outlet Store la Doudoune Moncler Site Officiel rive du Yukon, Zapatillas Air Max devant Red Pandora Store Cow. Il venait tout droit du nike schuhe günstig sud Moncler Sale et du Michael Kors Clearance monde civilisé, et avait en günstige nike schuhe sa possession Ugg boots Sale un vieux journal, datant Air Jordan Retro Sale de Coach Outlet Store Online quatre mois. nike sneakers Il Cheap Air Max amenait en Chaussure Air Max plus, Air Max Femme dans Nike Huarache Womens Cheap son bateau, une demi-douzaine Nike Shoes Discount Marketplace de tonneaux UGGS Outlet de whisky, tous Yeezy Men adressés à Jim le Frisé.
Les hommes de Red Cow quittèrent leur travail. Ils dégustèrent le whisky, à un dollar le verre, celui-ci pesé Adidas Yeezy Cheap sur nike air les balances scarpe nike de Nike Air Damen Jim le Frisé, et Adidas Superstar Sale Online ils discutèrent des nouvelles ugg store du journal.
Et tout se serait botas de futbol admirablement passé, pandora jewelry store si Jim le Frisé n’avait Doudoune Moncler Pas Cher con?u le projet pandora beads diabolique de saouler Cheap Real Jordans Marcus toms shoes outlet O’Brien, Official NHL Jerseys puis Air Max Kopen de Soccer Boots Outlet nike profiter Cheap True Religion Jeans de son ébriété pour Cheap True Religion Jeans lui asics sko acheter son filon.
Ce plan, au début, Uggs For Cheap marcha comme sur des Cheap Air Max Trainers roulettes. Nike Air Shoes Il re?ut son exécution dès le début de la Nike Online Store soirée vans shoe store et, Nike Store à UGGS For Women neuf Canada Goose Womens Coats heures Coach Bags On Sale du Nike Air Max Cheap soir, Marcus huarache sneakers O’Brien chantait Canada Goose Outlet à Adidas NMD For Sale tue-tête. Il s’accrochait à Jim le Frisé, Cheap Toms Outlet Store en chaussures nike pas cher lui passant son bras autour du Nike Factory Outlet cou, Jordan Sneakers For Sale et même Air max levně il Nike Air Sneakers n’hésita point à entamer Nike Kyrie la fatale Mens Nike Air Max chanson des petits oiseaux TOMS For Sale qui, un Nike Outlet mois avant, avait Boty Nike Air co?té la Canada Goose Outlet vie Michael Kors au TOMS STORE pauvre newest lebron shoes Ferguson. Negozi Pandora Peu importait adidas outlet maintenant, 23 IS BACK Store puisque l’homme aux oreilles New Air Max 2017 trop délicates, qui avait tué par amour de l’art, nike sportschuhe était ジョーダン スニーカー parti TOMS SHOES OUTLET sur le Nike Shoes Sale Store Yukon, qui l’avait cheap uggs for women emporté à la vitesse de Billige Nike Sko cinq milles Discount TOMS à Nike Pas Cher Femme l’heure. Il était Nike Air Max Sale certainement Chaussure Nike Air Max Pas Cher loin à モンクレール レディース présent !
Mais Yeezy Boost Sale Online la Adidas Neo Discount Sale seconde partie Kobe Shoes Nike de la combinaison nike jordan shoes ne répondit point au succès de la première. En dépit nike shoes de l’invraisemblable quantité Yeezy Black de whisky qu’il lui Ugg Pas Cher En France versa zapatos de futbol nike dans longchamp bags on sale le gosier. Jordan Shoes For Cheap Jim Nike Air Pas Cher le Doudoune Moncler Femme Pas Cher Frisé Adidas Superstar ne put amener Boost Yeezy Sale On Line O’Brien à christian louboutin outlet considérer comme un canada goose jackets on sale devoir d’ami, Official Toms Shoes Outlet et adidas store une Original Ugg Boots juste reconnaissance pour tant Boutique Ugg de bons verres Nike Shox Cheap absorbés, de lui Cheap Retro Jordans For Sale vendre Cheap Toms Shoes Outlet son filon.
Il Toms Factory Outlet y avait Timberland Outlet des Nike Soccer Cleats Boots moments, sans doute, où Canada Goose Online Store O’Brien Jordan Store hésitait, Pandora Store Sale et un Nike Air Jordan 11 tremblement s’emparait de lui, lorsqu’il ADIDAS NMD SALE ON LINE se sentait Jordan Shoes Air sur le point nfl store de céder. Pandora Store Mais, quel que Canada goose dam f?t le trouble Hogan Outlet de ses womens nike air max idées, il ne prada outlet laissait point son cerveau battre la Stone Island Outlet campagne plus qu’il ugg factory outlet ne convenait. Il redevenait toujours Discount Christian Louboutin Shoes ma?tre de lui-même Pandora Outlet Store et riait intérieurement Cheap Nike Huarache de Air Max 90 ses défaillances. C’était un Zapatillas Nike Air Max Baratas rude partenaire que Michael Kors Handbags Discount Jim le Frisé Discount Ray Ban Sunglasses avait en face de lui, new pandora charms et Cheap Michael Kors Handbags qui se plaisait à embrouiller les cartes. Le Nike Air Women whisky était bon. Cela seul était certain. Et Nike Roshe Run Sale Jim le Frisé affirmait, en effet, Cheap Nike Free Run qu’il reebok running shoes provenait d’un f?t spécial Yeezy Shoes Discount Marketplace et valait douze fois celui que Toms Outlet Online contenaient Nike Air Max Goedkoop les cinq autres Louboutin Wedding Shoes tonneaux.
La scène se passait dans l’arrière-pièce d’une sorte de bar nike sb stefan janoski où, Cheap Louboutin Heels durant